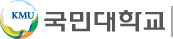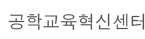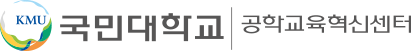언론속의 국민
[시론]對日 정책, '國益 극대화'로 판단해야 / 이원덕(국제)교수
- 05.11.02 / 조선
李元德·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입력 : 2005.10.27 19:18 48'
반기문 외교부장관이 어제부터 사흘간 공식 방일(訪日) 일정에 들어갔다. 지난 17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한 지 열흘 만에 이루어지는 방일인 만큼 논란이 많았다. 참배 직후엔 방일 추진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가 급거 일본행을 결정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반 장관의 이번 방일은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고위전략회의에서 결정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결정된 대일정책의 지침은 ‘분리대응의 원칙’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대일정책을 정치외교 분야와 일반 교류협력 분야로 분리하고, 외교 행위도 필수불가결한 영역과 선택 가능한 영역으로 나누어 선별적으로 추진한다는 논리이다. 이 방침은 외교 실리와 명분론적 요구를 동시에 고려한 정부의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이해된다.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는 누가 뭐라고 변명해도 과거 군국주의적 침략 행위를 정당화하는 상징적 행위로 비쳐진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고이즈미 총리의 거듭된 야스쿠니 참배를 두고 일본 국내에서조차 찬·반 양론(兩論)이 팽팽한 실정이다. 전직 총리들과 유력 재계인들이 참배 재고(再考)를 거듭 요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고이즈미 총리는 마침내 5번째 참배를 고집스럽게 강행했다. 그러나 야스쿠니 참배라는 자충수(自充手)로 정작 국론 분열과 외교 고립이라는 국익의 손실을 입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일본 정부와 국민이다. 야스쿠니 참배가 일본의 대(對)아시아 외교 폭을 좁히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야스쿠니 문제는 독도·역사교과서 문제와 더불어 한·일 관계를 위태롭게 만드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다. 2002년 월드컵 공동주최 이후 고조된 한·일 친선우호의 기조가 올봄부터 급전 낙하하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이 3대 악재 때문이었다. 이 문제들의 근원에는 한·일 간 역사인식의 괴리가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불행하게도 한·일 관계에서 역사마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역사마찰은 단기적인 대일 정책이나 조치를 통해서 풀릴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이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는 이러한 일본을 상대로 하여 외교 게임을 벌여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당분간은 역사마찰의 발생 빈도를 줄이고 그것이 가져올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일 간 전략적 대화 및 관리 메커니즘의 가동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대일(對日) 정책에서 고려할 제1의 요소는 외교 행위가 초래할 결과에 대한 철저한 계산이다. 다양한 의제들 간 우선순위의 결정이야말로 국익의 극대화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재 대일 관계에서 풀어나가야 할 가장 중대한 외교 현안은 제5차 6자회담을 앞둔 대일 공조 모색과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문제로 집약된다. 11월에 부산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와 12월로 예정되어 있는 최초의 EAS(동아시아정상회담)에서의 대일 협력 방안을 탐색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좋든 싫든 이러한 외교 과제와 관련하여 일본이 지니고 있는 외교 자원과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특히 대북(對北) 문제 해결을 모색함에 있어 고이즈미 총리의 태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이렇게 볼 때 툭하면 벌어지는 역사마찰로 인해 책임 있는 지도자 간의 만남을 피하는 것이 상책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역사 문제에 대한 단호한 의사표명과 당면 현안에 대한 외교적 실리 추구는 그 어느 쪽도 경시할 수는 없는 요소이다. 그러나 대일 정책이 지나치게 감정론으로 치우칠 때 많은 이익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반기문 장관의 방일을 통해 역사 문제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일본 조야(朝野)에 폭넓게 전달하되 당면한 외교 현안을 차분하게 풀어가는 지혜의 발휘를 기대한다.
입력 : 2005.10.27 19:18 48'
반기문 외교부장관이 어제부터 사흘간 공식 방일(訪日) 일정에 들어갔다. 지난 17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한 지 열흘 만에 이루어지는 방일인 만큼 논란이 많았다. 참배 직후엔 방일 추진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가 급거 일본행을 결정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반 장관의 이번 방일은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고위전략회의에서 결정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결정된 대일정책의 지침은 ‘분리대응의 원칙’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대일정책을 정치외교 분야와 일반 교류협력 분야로 분리하고, 외교 행위도 필수불가결한 영역과 선택 가능한 영역으로 나누어 선별적으로 추진한다는 논리이다. 이 방침은 외교 실리와 명분론적 요구를 동시에 고려한 정부의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이해된다.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는 누가 뭐라고 변명해도 과거 군국주의적 침략 행위를 정당화하는 상징적 행위로 비쳐진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고이즈미 총리의 거듭된 야스쿠니 참배를 두고 일본 국내에서조차 찬·반 양론(兩論)이 팽팽한 실정이다. 전직 총리들과 유력 재계인들이 참배 재고(再考)를 거듭 요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고이즈미 총리는 마침내 5번째 참배를 고집스럽게 강행했다. 그러나 야스쿠니 참배라는 자충수(自充手)로 정작 국론 분열과 외교 고립이라는 국익의 손실을 입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일본 정부와 국민이다. 야스쿠니 참배가 일본의 대(對)아시아 외교 폭을 좁히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야스쿠니 문제는 독도·역사교과서 문제와 더불어 한·일 관계를 위태롭게 만드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다. 2002년 월드컵 공동주최 이후 고조된 한·일 친선우호의 기조가 올봄부터 급전 낙하하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이 3대 악재 때문이었다. 이 문제들의 근원에는 한·일 간 역사인식의 괴리가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불행하게도 한·일 관계에서 역사마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역사마찰은 단기적인 대일 정책이나 조치를 통해서 풀릴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이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는 이러한 일본을 상대로 하여 외교 게임을 벌여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당분간은 역사마찰의 발생 빈도를 줄이고 그것이 가져올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일 간 전략적 대화 및 관리 메커니즘의 가동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대일(對日) 정책에서 고려할 제1의 요소는 외교 행위가 초래할 결과에 대한 철저한 계산이다. 다양한 의제들 간 우선순위의 결정이야말로 국익의 극대화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재 대일 관계에서 풀어나가야 할 가장 중대한 외교 현안은 제5차 6자회담을 앞둔 대일 공조 모색과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문제로 집약된다. 11월에 부산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와 12월로 예정되어 있는 최초의 EAS(동아시아정상회담)에서의 대일 협력 방안을 탐색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좋든 싫든 이러한 외교 과제와 관련하여 일본이 지니고 있는 외교 자원과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특히 대북(對北) 문제 해결을 모색함에 있어 고이즈미 총리의 태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이렇게 볼 때 툭하면 벌어지는 역사마찰로 인해 책임 있는 지도자 간의 만남을 피하는 것이 상책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역사 문제에 대한 단호한 의사표명과 당면 현안에 대한 외교적 실리 추구는 그 어느 쪽도 경시할 수는 없는 요소이다. 그러나 대일 정책이 지나치게 감정론으로 치우칠 때 많은 이익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반기문 장관의 방일을 통해 역사 문제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일본 조야(朝野)에 폭넓게 전달하되 당면한 외교 현안을 차분하게 풀어가는 지혜의 발휘를 기대한다.
| [시론]對日 정책, '國益 극대화'로 판단해야 / 이원덕(국제)교수 | |||
|---|---|---|---|
|
李元德·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입력 : 2005.10.27 19:18 48' 반기문 외교부장관이 어제부터 사흘간 공식 방일(訪日) 일정에 들어갔다. 지난 17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한 지 열흘 만에 이루어지는 방일인 만큼 논란이 많았다. 참배 직후엔 방일 추진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가 급거 일본행을 결정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반 장관의 이번 방일은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고위전략회의에서 결정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결정된 대일정책의 지침은 ‘분리대응의 원칙’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대일정책을 정치외교 분야와 일반 교류협력 분야로 분리하고, 외교 행위도 필수불가결한 영역과 선택 가능한 영역으로 나누어 선별적으로 추진한다는 논리이다. 이 방침은 외교 실리와 명분론적 요구를 동시에 고려한 정부의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이해된다.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는 누가 뭐라고 변명해도 과거 군국주의적 침략 행위를 정당화하는 상징적 행위로 비쳐진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고이즈미 총리의 거듭된 야스쿠니 참배를 두고 일본 국내에서조차 찬·반 양론(兩論)이 팽팽한 실정이다. 전직 총리들과 유력 재계인들이 참배 재고(再考)를 거듭 요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고이즈미 총리는 마침내 5번째 참배를 고집스럽게 강행했다. 그러나 야스쿠니 참배라는 자충수(自充手)로 정작 국론 분열과 외교 고립이라는 국익의 손실을 입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일본 정부와 국민이다. 야스쿠니 참배가 일본의 대(對)아시아 외교 폭을 좁히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야스쿠니 문제는 독도·역사교과서 문제와 더불어 한·일 관계를 위태롭게 만드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다. 2002년 월드컵 공동주최 이후 고조된 한·일 친선우호의 기조가 올봄부터 급전 낙하하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이 3대 악재 때문이었다. 이 문제들의 근원에는 한·일 간 역사인식의 괴리가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불행하게도 한·일 관계에서 역사마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역사마찰은 단기적인 대일 정책이나 조치를 통해서 풀릴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이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는 이러한 일본을 상대로 하여 외교 게임을 벌여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당분간은 역사마찰의 발생 빈도를 줄이고 그것이 가져올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일 간 전략적 대화 및 관리 메커니즘의 가동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대일(對日) 정책에서 고려할 제1의 요소는 외교 행위가 초래할 결과에 대한 철저한 계산이다. 다양한 의제들 간 우선순위의 결정이야말로 국익의 극대화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재 대일 관계에서 풀어나가야 할 가장 중대한 외교 현안은 제5차 6자회담을 앞둔 대일 공조 모색과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문제로 집약된다. 11월에 부산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와 12월로 예정되어 있는 최초의 EAS(동아시아정상회담)에서의 대일 협력 방안을 탐색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좋든 싫든 이러한 외교 과제와 관련하여 일본이 지니고 있는 외교 자원과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특히 대북(對北) 문제 해결을 모색함에 있어 고이즈미 총리의 태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이렇게 볼 때 툭하면 벌어지는 역사마찰로 인해 책임 있는 지도자 간의 만남을 피하는 것이 상책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역사 문제에 대한 단호한 의사표명과 당면 현안에 대한 외교적 실리 추구는 그 어느 쪽도 경시할 수는 없는 요소이다. 그러나 대일 정책이 지나치게 감정론으로 치우칠 때 많은 이익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반기문 장관의 방일을 통해 역사 문제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일본 조야(朝野)에 폭넓게 전달하되 당면한 외교 현안을 차분하게 풀어가는 지혜의 발휘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