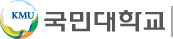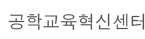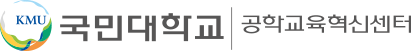혼돈의 ‘여말선초’ 처음으로 해부한 김영수 교수
“공민왕은 불신·광기의 군주” 격동기의 복잡한 권력투쟁
정치학자 눈으로 쉽게 풀어
우리 역사에서 1352년부터 1392년. 고려 공민왕 때부터 조선건국까지
‘여말(麗末) 40년’은 고려사이면서도 조선건국의 전사(前史)로서 더 큰 비중을 갖는 시대다. 대륙의 질서가 원(元)에서 명(明) 중심으로
바뀌고 있었고 고려 내부의 역학관계도 요동치고 있었다. 그 동안 이 시기는 공민왕 신돈 최영 이성계 정몽주 정도전 등 개별 인물을 중심으로 주목
받은 적은 있어도 ‘하나의 전체’로서 조명한 작업은 드물었다.
“역사에는 평화롭지만 평범한 시대가 있었고, 어렵지만 창조적인 시대가
있습니다. 여말은 전쟁과 폭정 속에서도 정치문화적으로 매우 창조적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정치와 사상을 입체적으로 해부한 최초의
저작 ‘건국의 정치’(이학사)를 펴낸 김영수 국민대 연구교수(46·사진). 97년 서울대 정치학과에서 받은 박사학위를 재집필한 이 책은 분량도
두 배 이상 늘어난 840쪽이다. 3년간의 일본 동경대 유학을 포함한 10년의 공부가 추가됐다. 흔히 ‘여말선초’(麗末鮮初)로 불리는 한국사의
대표적인 격동기를 읽어내는 텍스트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책을 검토한 국사학계의 서울시립대 이익주 교수는 “아주 복잡한 시기의 복잡한
정치를 정치학도답게 권력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쉽게 풀어낸 것이 이 책의 장점”이라며 “특히 이 시기에 대한 체계적인 단행본은 사실상 처음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책의 절반은 그 동안 역사학계에서 ‘개혁군주’로 불려온 공민왕의 정치를 해부하는 데 할애했다. “공민왕이
개혁의 의지를 가졌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설픈 개혁과 군신(君臣)간 신뢰의 파괴, 좌절과 연이은 실정(失政) 등을 보면 과연 그를
개혁군주라 부를 수 있을까 회의적입니다.” 김 교수가 복원해낸 공민왕은 오히려 불신과 광기의 군주다. 게다가 타락한 군주이기도 했다.
공민왕 후반기 국정을 좌지우지했던 신돈의 ‘대리정치’에 대해서도 지극히 부정적이다. “당시 부패한 정치상황에 대한 분노만 있었을 뿐 개혁을
이룰 만한 비전과 세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최근 끝난 TV드라마 ‘신돈’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해석이다.
여기서 반론(反論).
조선왕실의 입장이 반영된 ‘고려사’의 시각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 아닌가? 흔히 말하는 고려필망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 아닌가? “오히려
그 동안 학계는 ‘고려사’의 사료적 정확성을 폄하하면서 개인문집들에 바탕을 두고 당시 시대를 접근함으로 인해 전체로서의 여말선초를 보지
못했습니다.” 연구자 개인 취향에 맞는 인물들이 다소 과하게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탄생한
의미를 정신적 삶의 현세화, 정치적 삶의 윤리화, 폭정을 방지하기 위한 권력균형 세가지로 요약한다. 그러나 이 책은 완결본이라기보다는 새롭게
논쟁을 점화하는 신진학자의 도전으로서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이한우기자 hwlee@chosun.com